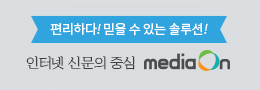[팩트UP=이세라 기자] “예전에는 회사가 나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내가 회사를 평가한다.”
지난 2023년 이후 기업 인사팀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는 ‘이직’과 ‘리텐션(retention, 인재 유지)’다. 잡플래닛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대기업의 평균 이직률은 12.7%로, 3년 전(6%)의 두 배를 넘었다.
퇴사의 중심에는 MZ세대(1981~2010년생)가 있다. 한 때 ‘조직을 바꾸겠다’고 말하던 MZ세대는 이제 ‘조직을 떠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여파가 가장 먼저 흔든 것은 바로 ‘연봉 구조’였다.
◆ “기업들 보상체계의 근본 재편성 중”
MZ 퇴사 러시 이후 기업들은 보상체계의 근본을 다시 짜고 있다. 핵심은 ‘시장가치형 보상’이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같은 직무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서 얼마를 받는지가 기준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례로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직무급제’ 시범 도입해 직무 가치 중심의 급여를 주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웅에는 외부 HR 데이터 반영해 연봉 밴드를 매년 조정해 준다.

그런가 하면 금융권에서는 고정급을 줄이고 성과연동·스톡옵션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고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 3년 리텐션 보너스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실제 기업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퇴사를 막기 위해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 지급’으로 대응했지만 지금은 ‘떠날 사람은 떠난다’는 전제 아래 인재가 들어오고 싶은 구조를 설계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연봉은 ‘평균’이 아니라 ‘시장’이 기준이 됐고 보상은 ‘충성’이 아니라 ‘성과’와 ‘희소성’이 기준이 됐다.
물론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연봉 구조 혁신의 반대편에는 조직 내 불균형이 생겨났다. 디지털·AI 직무의 급격한 연봉 상승이 특히 사무·관리직과의 격차를 키우고 있다. 일은 다 같이 하는데 연봉표는 다른 세상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직무별 평균 연봉 격차는 2018년 대비 1.7배 확대됐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성과주의가 강화될수록 보상의 공정성 논란도 커진다’고 전하고 있다.
◆ “새 화두는 보상 투명성”
최근 MZ세대들의 퇴사 러시 이후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는 ‘투명성’이다. (transparency)’**이다. 이제 임금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왜 그렇게 주느냐를 증명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답변이다.
A그룹 인사 담당자는 “임금의 과학화와 공개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왜 이 사람은 더 많이 받는가나 왜 나는 덜 받는가 등ㅇ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조직은 다시 흔들린다”고 전했다.
B그룹 인사 담당자는 “MZ 퇴사 러시 이후 연봉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전략자산이 됐고 기업은 임금을 유지비용이 아닌 투자비용으로 보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의 HR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주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그룹 한 인사 담당자는 “MZ세대의 퇴사 러시는 기업에게 위기였지만 그 후폭풍은 보상체계의 진화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며 “연봉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시장 감각의 거울이 된 만큼 기업이 그 변화를 얼마나 정직하게 반영하느냐가 향후 인재 경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