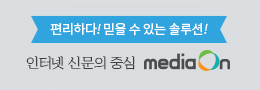[팩트UP=정도현 기자] 조직을 절개하지 않고 피 한 방울로 암을 찾아내는 ‘액체생검(liquid biopsy)’ 기술이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폐암·간암·췌장암 등 조기 발견이 어려운 고위험 암종에서 그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액체생검은 암 진단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기술 신뢰성과 사회적 제도화 없이는 ‘조기진단의 착시’가 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피 한 방울로 암을 찾는다(?)”
액체생검은 혈액·소변 등 체액 속에 떠다니는 순환 종양 DNA(ctDNA), 종양세포(CTC), 엑소좀(Exosome) 등을 분석해 암 발생 여부나 유전자 변이를 탐지하는 진단 기술이다. 기존 조직생검처럼 절개나 마취가 필요 없고 환자에게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조직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에게 액체생검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3~5일로 기존 조직검사(2~3주)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장점도 있다.

글로벌·국내 기술 각축전도 치열하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가던트헬스(Guardant Health), 그레일(Grail), 파운드메디슨(Foundation Medicine) 등이 시장을 주도한다. 이들은 폐암·유방암 등 다암종 검출 플랫폼을 상용화했고 민감도는 9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
국내에서는 GC지놈, IMBDx, 지노믹트리, EDGC 등이 각축 중이다. GC지놈은 AI 기반 폐암 조기진단 플랫폼 ‘FEMS’를 개발 중이다. IMBDx는 액체생검으로 폐암 돌연변이를 추적하는 ‘AlphaLiquid’ 기술을 상용화했다.
국내 연구진은 위양성·위음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tRNA 시그니처’, ‘엑소좀 miRNA’ 등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대병원 임상의학과 한 관계자는 “조직생검은 일부 환자에게는 접근조차 어렵다”면서 “반면 액체생검은 반복 측정이 가능해 치료 경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암 진단이 병원이 아닌 건강검진센터나 가정에서도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진단 시장 자체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액체생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임상적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액체생검 결과 해석에는 고도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 AI 알고리즘이나 클라우드 기반 판독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윤석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액체생검 키트의 정확도는 조직검사 대비 약 80~90% 수준으로 진단보다 보조지표’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암의 위치나 진행 단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선 환자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지만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데이터 통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조직 대신 피로’…왜 주목받나
문제는 위험요인과 정책적 과제다. 액체생검의 가장 큰 위험은 위양성(암이 아닌데 암으로 판단)과 위음성(암인데 놓침)이다. 위양성은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정신적 불안, 위음성은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보험 적용과 비용이다. 현재 국내에서 액체생검은 대부분 비급여로 1회 검사비가 80만~15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제한적 급여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임상 근거 부족과 민감도 편차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액체생검 시장은 2023년 55억 달러(약 7조5000억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22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 시장도 연평균 25% 이상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업계에서는 결국은 정확도와 데이터 신뢰성 싸움이며 AI·유전체 분석·바이오마커 발굴 등 다학제 융합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조기검진 목적으로 액체생검을 남용할 경우 실제로는 검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 “‘피 한 방울로 암을 찾는다’는 말은 더 이상 공상과학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기술의 속도만큼 신뢰의 검증도 필요하다”면서 “조기진단이 조기 불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윤리·정책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