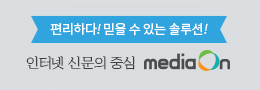[팩트UP=이세라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자체적으로 인력조정에 나선 가운데 직원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어디에서 끝을 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구조조정 이후 다올투자증권이 오뚜기처럼 일어설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관전포인트 하나…구조조정 여파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다. 목적은 비용 절감 차원. 지난해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타격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획(?) 이상의 직원들이 퇴사했다. 문제는 직원들의 퇴사 규모다. 최근 석달만에 150명 가량 다올투자증권의 명함을 반납했다.

실제 다올투자증권의 지난해 연말 전체 직원 수는 502명이었다. 그런데 지난 1분기 말 기준 직원 수는 총 352명이다. 정규직은 166명, 기간제 근로자는 186명 남았다. 불과 석달 만에 전체 직원의 30%가 줄어든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올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임원 상당수도 책임분담 차원에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어느 선에서 직원들의 수를 막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이번 구조조정이 성공일지, 아니면 실패일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전포인트 둘…핵심 멤버들 잔존 여부
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의 이번 구조조정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 다올투자증권 성장의 주역이었던 핵심인력들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점이 꼽힌다.
일례로 부동산PF 핵심 인력들이 경쟁사인 메리츠증권 등으로 이직했다. 이원병 전 다올투자증권 개발금융사업본부 상무를 필두로 총 45명이 메리츠증권으로 적을 옮긴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이들 중 일부를 기존 IB본부에 배치하고, 늘어난 인력 규모를 감안해 이 상무를 본부장으로 둔 ‘IB사업3본부’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소규모 팀 단위로 이직한 사례는 종종 있어도 이처럼 수십명이 한꺼번에 경쟁사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핵심인력이 빠진 상태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